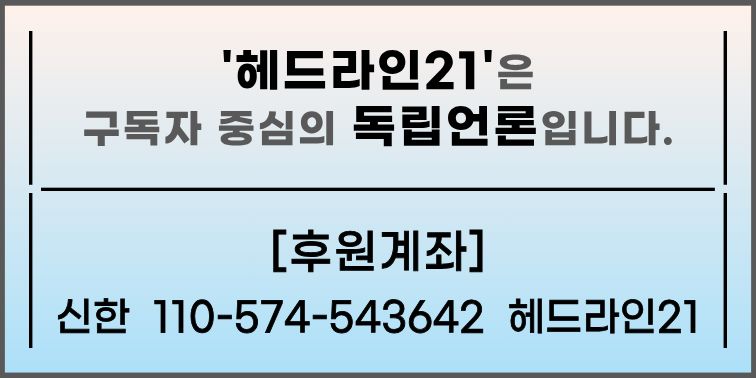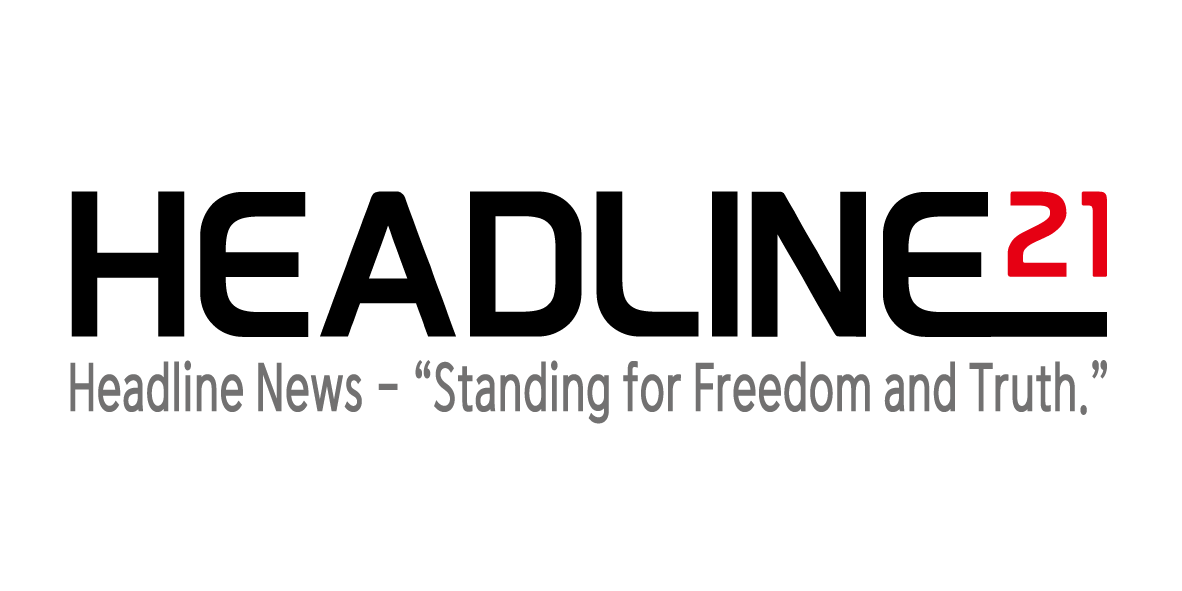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리 판단인지, 판단 착오인지, 혹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검찰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단순하다. 왜 항소가 멈췄는지, 그 결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다.
그러나 국민의 의혹과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그 직후 인사였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환수 가능액 7,800억 원이 걸린 사건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오히려 검찰 핵심 요직을 맡게 된 건 상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검사장 18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항명’으로 고발됐다. 지시 여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자만 먼저 압박을 받는 구조는 검찰 내부의 정상적 논의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검찰은 법률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은 성남시와 대장동 민간 업자들 간의 구조적 이익 배분 문제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공공 환수와 공직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검찰이 1심에서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473억 원만 인정했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환수 범위를 다시 다투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항소는 포기됐고, 그 결정 과정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과거 성남시와 연관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고, 대통령 본인이 당시 성남시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의 설명 책임은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정부·법무부·검찰 모두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론은 더 강하게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뇌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특검으로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엄정한 문책을 가하며, 정치적 판단에 흔들린 검찰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 세 가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회생은 기적이 아니라 환상으로 남을 뿐이다.